
저자 / 김상민
아무래도 달리기에 대한 동경이 있는 모양이다. 전에 보관함에 담아뒀던 영화도 그렇고 달리기에 관련된 작품이라면 한번 더 눈길이 가는 걸 보면 말이다. 이 작품도 그런 선상에서 읽게 된 작품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적당히 가볍고 적당히 즐거웠다.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던 때의 엉성함으로부터 시작해 마라톤을 완주하게 된 이때까지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작품은, 작가의 재치있는 입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글발'로 툭툭 웃음을 터트리게끔 만들며 끝까지 독자를 이끌고 함께 달려나간다.
언젠가 나도 푸른 새벽 공기를 가르며 폐가 시리도록 자유롭게 달려보리라, 원대한 꿈을 꾸게끔 만들곤 유유히 사라진 글은 아무튼 시리즈답게 짧은 글이라 금세 읽을 수 있었다. 아주 큰 장점도 단점도 없던, 무난한 독서의 경험을 준 시간이었다.

저자 / 원도
워낙에 짧은 글이기도 하지만 정말 후루룩 읽어버린 책. 좋다는 말이 많아 기대하고 읽었으나... 기대만큼 꽤 괜찮았다! 생각했던 방향은 아니지만 줄곧 이어지는 언니의 향연과 사연들은 흥미로웠고 부럽기도 했다. 요즘 장소나 관계에 대한 리프레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참이라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힘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이번 독서를 통해 다시금 깨달았달까.
원도 작가님이 글을 참 잘 쓰신다. 덕분에 쭉쭉 읽어내려갈 수 있었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됐다. 가끔가다 이 방향이 맞나? 싶은 부분이 몇 군데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아무튼, 언니'라는 제목에 부합하는, 즐거운 경험을 주는 글이었다.
요약하자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게 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고보니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폰에 새 번호를 저장한 게 언제더라. 까마득해 웃음마저 난다. 하여튼. 읽었던 아무튼 시리즈 중에 손에 꼽을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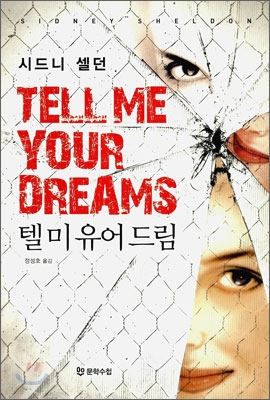
저자 / 시드니 셀던
와 드디어. 드디어 읽었다.
구하려고 노력 많이 했다가 이번에 운 좋게 구하게 되어 읽을 수 있었다. 구매는 알라딘 중고센터. 상태 최상이라길래 고민하고 질렀는데 생각보다도 훨씬 좋은 상태인 책이 도착해서 진짜 하늘이 도왔다 싶었지. 출간 10여년이 된 책인데 이렇게 깨끗할 수가.
즐거운 마음으로 독서를 시작했다. 얼마나 재밌을까 기대하면서.
줄거리는 간단하게. 컴퓨터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는 세 여성의 주변에서 알 수 없는 의문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이후에 밝혀지길 사건의 범인은 아리따운 여성 애슐리 패터슨이다. 여기서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은 세 여성이 결국엔 모두 한 사람, 애슐리라는 것이다. 나머지 두 사람은 애슐리가 어릴 적 충격으로 인해 만들어낸 또다른 분신들이었던 것. 해리성 정신 장애를 겪고 있던 애슐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나머지 분신에게 자신을 빼앗가 살인을 했던 셈이다. 이 사실은 중반부에 미리 밝혀지며 그 이후로는 이 케이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법률 공방과 그녀에 대한 정신 치료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결말은 애슐리가 두 분신과 합해지며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병원을 떠나 사회로 복귀하면서 끝나는 것이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부르는 노래는 살인자 분신이었던 토니가 했던 것이다. 내 생각엔 굳이 그 노래를 마지막으로 넣은 걸 보아 그 분신이 남아있음을 뜻한 게 아닐까 한다.
텔 미 유어 드림. 기대가 어마무시했다. 유명작가 시드니 셀던의 여러 작품 중에서도 손꼽히는 유명작이니까.
결과적으로 감상을 말하자면 엄청난 페이지 터너이긴 하지만 소름 끼칠 정도의 스토리는 아니었다 정도. 아무래도 책이 발간되고 1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보니 비슷한 이야기류를 많이 접했던 게 요인인 것 같다. 예상했던 바대로 스토리가 진전되가는 묘한 쾌감 아닌 쾌감과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던, 그런 맛. 해리성 정신 장애라든가, 그 원인이 어릴 적 아빠의 성적인 학대 때문이라든가 하는 것은 읽으면서 미리 읽히는 것이어서 알고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읽게 만드는 그 힘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진심 궁금했다. 나 왜 이렇게 계속 읽고 있지? 했었거든. 500여 페이지의 책을 이렇게 빨리 다 읽기도 오랜만이라 얼떨떨할 정도였으니 말 다했다. 페이지터너였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진심으로 홀린 듯 계속 페이지를 넘기게 됐었으니까.
스토리가 마무리 되고 뒷부분에 작가의 인터뷰가 실려있는데, 시드니는 이야기에 나오는 것이라면 그냥 잠깐 언급되는 카페 이름이라도 꼭 자기가 가본 곳만 쓴다고 한다. 나라도 직접 방문해본 곳만. 자신이 가보고 듣고 경험해본 일들을 쓰기 때문에 그토록 쉽고 간결하면서도 이해가 잘되도록 쓸 수 있었던 걸까? 나한테도 필요한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경험이 적다보니 지어내기만 바빠서. 물론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쓰면서도 느끼거든. 내가 아는 것, 경험한 것은 술술 풀리듯 적힌다는 걸. 그리고 내가 쓸 때 술술 풀렸던 부분은 읽힐 때도 물흐르듯 부드럽다는 걸. 결국 잘 읽히는 좋은 글을 위해서는 내 경험이 풍부하고 잘 알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흠... 되도록이면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해야겠군...이라는 생각이.
여튼. 좋은 경험이었다. 스토리가 엄청난 반전을 주거나 특출난 건 아니었지만(10년 전에 읽었다면 훨씬 재밌었을 것 같기는 하다) 나도 모르게 페이지를 넘기게 하는 힘, 잘 읽히는 그 힘은 분명 신기하고도 본받을 만한 점이었다.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다.
별점 3/5
'W'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달콤한 나의 도시 - 정이현 (0) | 2024.11.17 |
|---|---|
| 나의 F코드 이야기, 소울 (2) | 2024.11.16 |
| 부지런한 사랑 - 이슬아 (0) | 2024.11.14 |
| 내게 무해한 사람, 리얼리티 트랜서핑 2 (1) | 2024.11.13 |
| 리얼리티 트랜서핑 1 - 바딤 젤란드 (2) | 2024.11.12 |